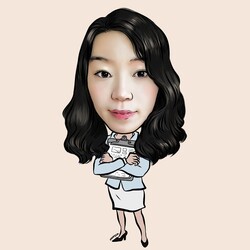![[사진=unsplash]](https://cdn.newscan.co.kr/news/photo/202308/300696_205501_1538.jpg)
왜 이렇게 친구 만나기가 힘든 걸까. 어릴 때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은 얼굴 한 번 보려면 몇 달 전에 약속을 잡아도 될똥 말똥이다. 그 어렵다는 골프장 부킹도 이것보다는 쉽겠다.
그렇게 몇 번의 조율 끝에 성사된 점심 약속. 친구 중 하나가 저녁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점심 약속으로 급변경한 자리였다. 늦둥이 막내를 학원에 데려다줘야 한다나 어쨌다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삶이란 참....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 시간 잡는 건 어려웠지만 점심 메뉴 고르는 건 너무나 간단했다. 한 친구가 주장한 ‘여름엔 당연히 삼계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 사람들은 아저씨들이 보양식에 목을 맨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줌마들도 보양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건 별반 다를 바 없다.
뜨끈한 삼계탕 한 뚝배기에 인삼주 한 잔 곁들인 점심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는 네 여자의 분주한 손길 속에 저물었고, 그냥 가기 아쉬웠던 우린 커피나 한 잔 하자며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깔끔하게 식사를 통일했던 친구들은 역시나 깔끔하게 커피로 대동단결했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고? 커피가 싫으니까. 쓰기만 한 커피를 도대체 왜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럽을 많이 넣으면 되지 않냐고? 시럽 한 통을 다 부어넣어도 여전히 혀끝을 맴도는 쌉싸래함. 태생부터 나는 그 쌉싸래함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다른 걸 주문해야만 했다. 그리고...
난 단지 다른 걸 골랐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들의 상냥하기(?) 그지없는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애들이나 먹을 법한 음식을 중년의 여성이 그토록 당당하게 주문할 일이냐는 게 이유였다. 주변 사람들이 흘끔흘끔 눈치를 보며 우리를 쳐다볼 정도의 상냥함이었으니 미루어 짐작이 갈 것이다. 그나마 표준말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충격이 덜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오며 가며 먹어온 팥빙수가 내게는
행복한 추억을 이끌어내는 나만의 부적이었던 셈이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네이티브 경상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욕설이 얼마나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지. 고작 팥빙수 하나 시킨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싶어 한편 억울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앞에 등장한 옛날식 팥빙수의 고운 자태가 방금 전 들었던 그 욕마저 까맣게 잊게 만든다.
떡과 팥, 연유 그리고 우유 섞인 얼음이 빚어낸 정갈한 모양새. 한 스푼 가득 떠서 맛을 본다. 혀끝에 부딪쳐오는 얼음의 부드러움은 나풀대는 치맛자락을 흩날리며 승천하는 선녀처럼 이내 사라져간다. 황홀하다. 잠깐 동안의 설움이 눈 녹듯 스러진다.
근데 있지. 뭔가 아쉽다. 뭘까, 뭘까? 그랬다. 그 맛엔 추억이 들어있지 않았다. 세련된 비주얼과 풍부한 식감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기억하는 바로 그 맛. 예전 팥빙수는 이런 게 아니었다. 적어도 내 기억은 그렇다.
내 첫 경험(?)은 초등학교, 팩트에 충실하자면 국민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그해 여름, 한 할아버지가 구루마에 파란색의 녹슨 빙수기를 싣고 다니면서 팥빙수를 팔았다.
얼음은 수북한데 팥은 별로 없고 우유를 조금 넣은 다음 빨강 파랑 색소를 넣어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줬던 그거. 기억의 편린이 조금씩 다를 뿐, 친구들의 첫 경험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추억하는 팥빙수의 모양은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 요즘의 모양새와는 달리 얼음과 팥, 이 두 가지 위주의 순수한 구성이었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파란색 빙수기다. 어떻게 보면 재봉틀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머리에 바퀴를 달아놓은 에펠탑 같기도 한 그 파란 기계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돌려 얼음을 갈아야 했던 그 수고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맛의 근원이 아닐까.
기계에 큼직한 얼음을 올려놓고 손잡이를 돌리면 대팻밥처럼 스윽스윽 밀려나온 결 고운 얼음. 그렇게 갈린 얼음은 꽃잎이 되어 그릇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 하얀 꽃들이 그릇에 소복이 쌓이는 순간, 잠시 후면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얼음탑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원하는 간절함이 함께 자라나곤 했다.
물론 얼음탑은 언제나 거기까지였다. 내 기대에는 절대 못 미치는 높이의 얼음꽃 위에 할아버지는 뭉글뭉글한 미숫가루와 팥을 올리고 연유를 뿌린 후 쫄깃한 떡을 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려졌던 파란 물과 빨간 물이 선명한 보색대비 효과를 이루고 나면 비로소 내 앞으로 그릇이 옮겨졌다.
우리가 추억하는 팥빙수의 모양은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 요즘의 모양새와 달리 얼음과 팥, 이 두 가지의 순수한 구성이었다
오자마자 허겁지겁 먹어야 정상이었겠지만, 나도 친구도 그럴 수는 없었다.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도 먹어야 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선 안 될 노릇이었다. 아깝지만 녹기 전에는 먹어야 했으니까. 마침내 한 입 꿀꺽 하는 그 순간, 얇게 저며진 팥빙수의 얼음은 입속에서 부드러운 눈꽃을 피우며 녹아내렸다. 그걸 먹으며 난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
그랬다. 내 팥빙수는 그거였다. 쓰디쓴 인생의 맛을 몰랐던 그 시절, 팥빙수를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때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누려보고 싶은 욕망 내지는 기원. 그러니까 오며 가며 먹어온 팥빙수가 내게는 행복한 추억을 이끌어내는 나만의 부적이었던 셈이다. 먹는 부적이라, 나쁘지 않은데.
오늘도 여전히 날씨는 더울 모양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름은 덥다. 얘들아, 이런 날엔 아무래도 부적 한 사발 해야 할 것 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