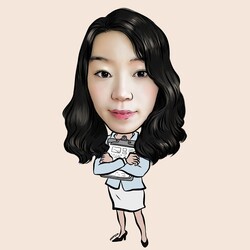달을 보았다. 추석이었다.
새삼 내 삶이, 그리고 당신들의 삶이 참 팍팍하다는 느낌을 받은 건 그때였다. 지금껏 살아져온 수많은 밤,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있던 그 달을 보지 못하고 살아올 만큼 우리네 삶이 비루하고 곤궁했음이 상기된 때문이었다. 그저 머리를 한번 치켜 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주할 수 있던 달을 왜 그리도 못 보고 살았을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 나는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야 했다. 무서웠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을 테고. 찰나 같은 잠시였다.
노래가 공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잠깐의 평안은 다시금 어둠에 먹혔고 있지도 않은 엄마를 불러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공포에 저항하던 바로 그 순간, 문득 누군가 내 자그마한 걸음에 맞춰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빨리 걷든, 느리게 걷든, 혹은 잠시 멈추어야만 했던 그 순간에도 항상 내 걸음에 맞춰 내 곁에 나란히 서주었던 그것, 달이었다.
행여 있을지 모를 돌부리를 조심하라며 내 머리 위를 밝혀주던 그 달, 생각해보면 내겐 그 달 같은 존재들이 여럿 있다. 부모가 그럴 테고 친구들이 또 그렇다. 너무도 소중한 그 사람들이 있어 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크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중이다.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죄송스런 맘을 지니게 해주는 그들이 있어 내 인생이 그럭저럭 꾸려지는 중일 지도.
그러나 그 맘조차 보여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내게 사탕은 깨먹는 것이 아니라 녹여먹는 것이란 걸 몸소 보여줬던 그 사람. 나의 외할머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이면 새삼 그의 부재를 깨닫게 된다. 슬픔일까, 그리움일까. 달처럼 언제나 나를 바라봐주던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도 달은 뜬다. 추석은 지나간다.
나도 당신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길 갈망한다
시장을 간 게 문제였다. 평소엔 가지도 않던 그곳을 찾은 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서였다. 그러다 문득 내 눈에 들어온 일상적인 시장의 풍경에 절로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다.
사실 그 날 그 자리에서 내가 울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근데도 눈물이 났다. 아, 창피해. 혹시라도 지나가던 행인들이 날 보기라도 했다면... 코 푸는 척 눈물 닦고는 이제 그만 눈을 떼야지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다.
흔적만 남은 여름 햇살 감싸 안던 그녀의 구부정한 허리가, 나물 다듬다 생긴 생채기 가득한 주름진 손이, 때때로 가느다랗게 내뱉던 탄식 같던 한숨들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던 때문이었다. 핑계를 대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분명해 보이는 은비녀 때문이었다. 수학여행 가서 샀던, 조악하게 도금된 은비녀. 그게 내가 처음으로 당신에게 드렸던 선물이었지 아마.
![[일러스트=공유마당_알버트커뮤니케이션]](https://cdn.newscan.co.kr/news/photo/202309/300899_205886_5450.png)
그 은비녀를 받은 날, 당신은 참 많이도 기뻐했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당신만 바라보던 어린 새끼를 모기장 안으로 밀어 넣고는 당신은 바깥에 남아 모기와 씨름하며 남아있던 일들을 해야만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남겨진 나는 빨갛게 타올랐다 쓰러지던 모기향만 바라보며 당신을 기다리곤 했다. 이젠 흐릿해진 어린 시절의 추억 내지는 그리움이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마침내 당신이 모든 일을 끝마치고 들어왔을 때, 난 이미 잠들어 있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기다렸던 기억이 선연하다. 당신이 피워준 모기향과 당신이 펼쳐둔 모기장 덕에 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음에도 감사함 대신 서운함을 토로하던 참 철없던 아이였다.
그런 철없는 손녀를 보며 당신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듣고 싶다. 알고 싶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젠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그 늦은 시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젠 알 만한 나이가 된 때문이다.
물론 그때의 당신처럼 어린 새끼를 먹이고 입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할 나이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숱한 고민들에 휩싸여 있었을 테니까.
내일은 저 작은 입에 무얼 넣어줄까, 머리는 어떻게 땋아줄까. 어디 그것만 있었을까. 당신은 항상 내게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좋은 거 안겨주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고민이 끊일 틈이 없었을 거다.
지금의 난 좋은 걸 입고 맛있는 걸 먹으며 산다.
근데 당신은 한번이라도 그래본 적이 있었나 싶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와 생각하니 또 눈가가 시큰해진다. 그런 당신에게 그땐 왜 그랬을까? 당신이 하는 말에 한 번도 순응해본 적 없었던 철없는 아이를 돌보느라 참 힘들었겠다. 당신.
지금의 난 좋은 걸 입고 맛있는 걸 먹으며 산다. 근데 당신은 한번이라도 그래본 적이 있었나 싶다. 언제나 내가 먼저였으니 그럴 수밖에. 덕분에 제대로 된 무언가가 당신 입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
자신을 위해 맛난 거 챙겨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그 좋아하던 사탕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지 말아야 했다. 그래도 매번 그런 건 아니었음을 위안 삼아야 할까.
![[사진=공유마당_최문석]](https://cdn.newscan.co.kr/news/photo/202309/300899_205887_1855.jpg)
기억난다, 그 사탕. 가끔 당신이 사탕먹는 걸 볼 때가 있었다. 성한 이가 거의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여먹느라 한참동안 우물거리던 당신의 야윈 뺨. 한번만이라도 그 뺨을 어루만졌으면 좋았을 걸. 그때의 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뭐란 걸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였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무가치하게 흘려보냈다.
사탕이 녹아드는 그 자잘한 시간들이 쌓이고 싸이면서 난 어른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당신은 훌쩍 떠나버렸다. 그 날 이후 당신은 내게 달로, 사탕으로 남았다.
가끔, 아주 가끔 보게 되는 달처럼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당신. 거한 점심을 먹고 계산대 위에 놓인 사탕을 무심코 짚어들다가 당신을 떠올리는 일이 점차 줄어가고 있음이 더할 나위 없이 서글프지만 그게 삶이란 걸 이제는 안다.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란 것도 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당신들. 시간을 쪼개가며 바지런을 뜨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라 믿는다. 나 역시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
그럼에도 단 하나, 사탕을 녹여먹는 그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당신을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 나만 그럴까. 내겐 사탕이 그러하듯,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들만의 사탕을 녹여먹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당신의 사탕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