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이란 단어를 전 세계에 전파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먹방 유튜버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라면 10개는 그저 간식거리에 불과할 정도라는 먹방 유튜버들이 이 나라에 어디 한둘이든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것에서조차 국뽕을 느끼는 것이 비정상적인 걸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 최고기록이 라면 두 개에 불과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히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느낌은 아닌 모양이다. 외국인들에게도 놀라운 건 마찬가지니까. 덕분에 오늘도 먹방 유튜버들의 조회수는 폭발 중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TV에서도 먹는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있다. 한 번에 라면 스무 개를 먹는 유튜버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커다란 위장을 지닌 연예인들이 출연해 우리나라의 갖가지 음식을 소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대표적인 연예인을 꼽자면 개그맨 김준현이나 유민상 등이 있다. 먹방 프로그램의 선구자 격으로 꼽히는 ‘맛있는 녀석들’의 메인 캐릭터였던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그중 최고로 꼽히는 이를 들자면 역시 개그우먼 이영자가 아닐까 싶다. 먹는 양이 많아서라기보다 음식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큰 때문이리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전국 팔도의 맛있는 음식을 맛깔나게 소개하는 그녀 덕에 몇몇 음식이 불티를 이룰 정도로 음식에 관한 파급력이 가장 강한 연예인인 그녀는 휴게소 음식에서부터 길거리 음식, 알려지지 않은 노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해왔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은 그녀의 음식 리스트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개인적으로는 한남동의 장작구이 통닭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치킨이 전 세계에 위용을 떨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였던 통닭이 뭐가 그리 인상 깊을까 싶겠지만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다. 맛도 맛이겠지만 그때의 상황이 더 기억에 남은 때문이기도 하다. 이영자가 방송 중에 한 멘트를 보자.
“난 체했을 때 여기로 와. 잘 구워진 통닭을 먹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려서 말이지.”
캬아, 막힌 속을 통닭으로 뚫어낸다는 그 말만큼 음식에 진심인 경우가 또 있을까. 일견 얼토당토않은 말이지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필자가 이번 구정에 몸소 겪은 일이니 말이다.
바쁜 일상에 치이고 스트레스를 껴안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끼니를 때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소화제는 필수 상비약이 될 수밖에 없다.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장 장애 하나쯤은 안고 살기 마련이다. 워낙 바쁜 일상에 치인 탓도 있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를 수시로 껴안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끼니를 때우는 게 쉽지 않은 때문이다. 덕분에 소화제는 필수적인 가정상비약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어트라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비만과는 거리가 먼 몸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몸(?)을 가지고 명절에 시골 본가로 가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다.
“넌 못 먹고 사니? 얼굴이 그게 뭐냐고?”
이 땅의 평범한 엄마나 이모, 혹은 외숙모라면 오랜만에 본 자식이나 조카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반향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식의 엄청난 음식 공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필자가 그랬다.
“뭐 좀 줄까? 어디 보자.”
도시에서라면 잘 먹지도 않는 아침을 거하게 먹고 난 불과 두어 시간 뒤의 상황이다. 아직 배도 꺼지지 않은, 정확히 말하면 아침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과분한 성찬 덕에 더부룩해진 속에 시달리는 그 상황에서 겪는 사건이었다.
“아침 먹은 게 체했나 봐. 생각 없어.”
보통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반응은 이래야 한다. ‘소화제 줄까’ 내지는 ‘콜라라도 하나 마셔’ 따위의 반응 말이다. 이게 상식적인 대응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명절 본가에서의 반응은 이런 상식 따위를 애시당초 모르는 투다.
“먹기는 뭐 먹은 게 있다고? 참새 눈꼽만큼 먹어놓고. 잔 말 말고 과일이랑 전이랑 줄 테니 먹어.”
아무리 손사래를 친들 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수십 년간의 경험칙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터니 결국은 쟁반 가득 담긴 사과니 배니 곶감과 명태전, 고구마전, 오징어전이 차곡차곡 쌓여진 탑 앞에 마주할 밖에.
놀라운 건 평소의 서너 배를 저장한 위장이 이 때만큼은 음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루 세 번의 끼니와 앞뒤로 이어진 세 번의 간식 타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 명절의 일상적인 풍경이 된다.
그렇게 먹어도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는 게 정상이 아닐까.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탄산음료를 달고 살게 되는 건 기본이고 게으르디 게으른 천성 탓에 1km 거리도 차를 타야하던 사람이 수시로 동네 한 바퀴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물론 그것만으로 더부룩해진 속을 온전히 달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사나흘의 격렬한 전투(?)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몸이 머리를 앞서가는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
![[사진=프리픽]](https://cdn.newscan.co.kr/news/photo/202402/301452_207023_5432.jpg)
“맛있겠다.”
TV에 등장한 음식을 보며 맛있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위장은 용량 초과로 피눈물을 흘리는 중이었다.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발언이었다. 일종의 자신감이랄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음식을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뇌의 경고를 무시한 거였다. 어리석을 정도로 호기로운 이 발언은 금세 모친을 자극해버리고야 만다.
“머시기야, 나가서 통닭 한 마리, 아니, 한 세 마리 튀겨 와라.”
아뿔싸,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이미 통닭 주문이 들어가고 난 후의 일이었다. 결국 30여분 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노릇노릇한 통닭 세 마리가 상 위에 오르고 말았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 역시 저녁을 먹고 나서 두어 시간 뒤의 일이다. 솔직히 이것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 하루 다섯 끼의 식품 공급으로 인해 위벽이 최대치로 늘어난 상황이었으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음식은 그런 거다. 그 안에 애정이 깃들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포만감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먹나 보다.
밥상 앞에 동그랗게 모여 앉은 식구들은 이미 저마다 다리 하나씩을 뜯으며 수다삼매경에 빠져갔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빠가 노란색 갱지봉투에 담아왔던 그 통닭을 행여 뺏길 세라 허급지급 삼키던 수준의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깨작거리던 수준 또한 아니었다. 그렇게 금세 세 마리의 통닭은 뼈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잘 구워진 통닭을 먹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린다는 말이 단순한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통닭만 그런 건 아니란 것 또한 분명하다. 필자에게 건네진 그 어떤 음식이라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애정을 먹는다고 해야 옳을 일이다. 세상 모든 자식은 부모의 애정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필자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다.
음식은 그런 거다. 그 안에 애정이 깃들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포만감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먹나 보다. 한 가지 부작용이라면 수시로 소화불량에 시달려야 하지만 그 정도는 앞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의향이 있다. 다이어트, 그런 건 개한테나 줄 일이다.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한 어느 중년 여성의 넋두리를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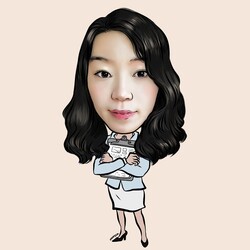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냉채족발, 낙곱새...K-마리아주 '음식 궁합'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발 동동' 기다린 방어집의 추억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차가운' 냉면과 '따뜻한' 친구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대신 팥죽 먹는 여자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실패한 어생(漁生) 먹태의 유쾌한 반란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MZ는 모르는 'K-숙취' 최고의 해장?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자동차 타이어'에 짓밟힌 최애 음식, 육회
- 통닭으로 '소화'하던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