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하나 기자]](https://cdn.newscan.co.kr/news/photo/202401/301333_206762_949.jpg)
안다. 내가 꽤나 삐딱한 족속이란 걸.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난 노를 외친다’는 광고 카피에 열광하고 시대의 트렌드리더 지드래곤 오빠가 오늘밤은 삐딱해지자 노래했을 때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던 인간이 나였으니까.
잠깐만, 이건 짚고 넘어가자. 삐딱한 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남들과는 조금 생각의 궤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인간적으로 흠결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게 스스로 모나지는 않았다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난 연말 벌어진 일은 내가 단지 생각이 삐딱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삐딱한 그런 인간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린다 싶긴 했다. 그 즈음 날씨가 쌀쌀해지는 통에 찾아든 감기에 시달리는 중이었다. 뭔가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해지는 와중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밥 먹자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원하는 음식이 냉면이었다는 점이었다. 컨디션이 좀 그래서 냉면 말고 국밥 같은 걸 먹자고 했는데 요지부동이었다. 어제 너무 달려서 꼭 해장을 해야 한다는 그. 해장엔 냉면 육수보다 좋은 게 없으니 반드시 냉면을 먹자고 우기지 뭔가.
사실 그때라도 거절했어야 옳았다. 근데 그러질 못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였고 나름 베스트프렌드라는 친구의 청을 뿌리치기가 좀 그랬거든. 결국 냉면집, 그것도 소위 말하는 서울 냉면 맛집 중의 하나로 들어갔다.
모르진 않았지만 한 그릇에 만육천원이 떡하니 박혀있는 메뉴판을 보는 순간, 안 그래도 꿀꿀한 기분이 더 바닥으로 처박혔다. 뭐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다. 이미 감기균에 점령당한 몸뚱아리가 차가운 냉면 육수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던 모양이었다. 그걸 보던 친구가 혀를 차며 그러더라.
“촌스러운 것, 원래 냉면의 진미는 겨울에 먹어야 제대로 느끼는 거라고. 넌 아직 멀었어.”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없다.
평소라면 술술 넘어갔어야 했을 냉면 면발이 빨래줄을 먹는 기분이 들 정도로 거북하기 짝이 없었던 걸 보면 말이다.
친구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평소엔 그것보다 더 심한 구박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였고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정도의 말이었음에도 순간 내 입에서 뾰족한 송곳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원래란 게 어딨어. 누가 그래? 헌법에 나와 있기라도 하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얘기 좀 하지 마.”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음에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차디찼다는 걸 느끼며 아차 싶었다. 방금 전 마신 살얼음 낀 냉면 육수도 그보다는 차지 않았으리라. 잠깐의 정적, 그리곤 우리 사이에도 살얼음이 꼈다.
내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음을 모를 녀석이 아니었으니 더 그랬을 거다.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없다. 평소라면 술술 넘어갔어야 했을 냉면 면발이 빨래줄을 먹는 기분이 들 정도로 거북하기 짝이 없었던 걸 보면 말이다.
결국 한 해의 마지막 만남은 응당 이어지기 마련인 카페의 수다조차 생략한 채 종료되고야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친구 녀석이 뾰족한 내 송곳에 반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만약 그랬다면 간만에 제대로 한판 붙을 게 뻔했으니까.
다들 잘 알 거다.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나면 집에 들어와 이불킥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내가 그랬다. 나이가 어리기라도 하면 철이 없어 그랬다는 핑계나 대겠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는 나이니 더 창피하고 속상했다.
새롭게 바뀐 나이 계산법을 적용한다 해도 이젠 50이 넘어버린 나다.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데 말짱 거짓말인 모양이다. 하늘의 뜻은 고사하고 내 뜻도 모르는 인간이 나인 것을 보면 말이다. 그나마 친구는 달랐던 모양이다. 자기도 기분 나빴을 텐데 내색도 안 하고 간 걸 보면. 그것도 모자라 나를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 문자까지 보내왔다는 게 더 쓰라렸다.

‘너 몸이 안 좋긴 한가보다.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약 잘 챙겨먹고 얼른 나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제라도 답장을 했어야 했지만 그조차도 할 수 없었다. 옹졸하기 짝이 없는 내 심보가 행여라도 들킬까봐서였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말았다. 안 그래도 추운 연말이 더 추웠던 이유였다. 나를 덮친 감기는 해를 바뀌는 동안 세력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온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그 즈음,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 들으니 아직도 안 좋은가 보네. 귀찮다고 약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먹고.”
너무 창피해서 원래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처럼 연기를 했다.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아프니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 행동도 본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달까. 그런 하잘 것 없는 연기에 속을 만큼 어리숙한 친구도 아니었고 그럴 나이도 아니었다. 그래도 친구는 넓디넓은 마음으로 속아주려 했나 보다.
“띵동.”
잠시 후 울리는 문자 알림.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죽집 기프티콘을 보낸 거였다. 어디 하나 예쁠 것 없는 인간도 친구라고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그 녀석에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샘이 났다.
나랑 나이도 같고 사는 것도, 하는 일도 고만고만한데 생각의 차이는 왜 이리 큰 지를 새삼 느껴서였다. 친구의 마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친구가 보내준 삼계전복죽의 효능 때문이었을까.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몸이 가벼워지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더욱 명확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못났었다는 것, 그리고 친구에게 사과해야한다는 것.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였다.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 사과를 해야 옳은데 이상하게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이리 야박한 걸까. 밖에서는 내 잘못이 아닌 일이라도 사과를 잘도 하면서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덕분에 애꿎은 핸드폰만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해야 했다. 한번 핸드폰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도 참 못났다 싶은 생각만 들었지만 역시나 통화 버튼을 누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날 밤 난 어느 때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꿈에 냉면이 나왔던가. 모르겠다.
중요한 건 비로소 내 맘이 홀가분해졌다는 것뿐.
바로 그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켜놓은 TV에서 냉면 맛집을 소개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던 것. 친구와 종종 가던 냉면 맛집에 비하면 퀄리티가 떨어져보였지만 아무려면 어떤가. 이야말로 신의 계시에 다름 아니었단 게 중요할 뿐이었다.
“00번 틀어봐. 저 집 냉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우리 먹으러 갈까? 매번 가던 집에 비하면 가격도 싸고 육수도 훨씬 감칠맛 있어 보이고.”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너무 속보이는 멘트란 걸 나도 알고 친구도 알았지만 이번에도 친구는 속아주었다.
“그러네. 사실 냉면 한 그릇에 만육천원은 오바지. 너 다 낫고 나면 가자. 이 언니가 보너스 받았으니 냉면에 편육까지 쏠게.”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는 수다를 떨었다. 핸드폰이 핫팩이 되고서야 비로소 우리의 수다는 막을 내렸다. 그날 밤 난 어느 때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꿈에 냉면이 나왔던가. 모르겠다. 중요한 건 비로소 내 맘이 홀가분해졌다는 것뿐. 길고 긴 연말연시가 그렇게 저물었다.
사족: 그 며칠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그 냉면집으로 갔다. 방송 덕분인지 길게 늘어선 줄을 만나야했고 평소라면 스킵할 나였지만 찬바람 맞으며 그 줄을 온전히 소화해냈다. 그를 통해 얻게 된 교훈 아닌 교훈 몇 가지를 전한다.
첫째, TV 맛집 소개는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것.
둘째, 아무리 욕해도 비싼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셋째,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난 냉면에서 인생을 배워가는 중이다. 모쪼록 남은 내 삶도 냉면 면발 넘어가듯 술술 잘 넘어가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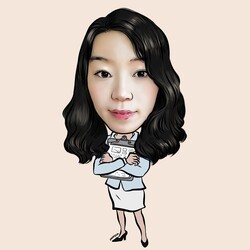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대신 팥죽 먹는 여자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실패한 어생(漁生) 먹태의 유쾌한 반란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측은지심'이 만들어낸 짬짜면과 칼제비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맵찔이'가 사는 법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육개장이 곁들여진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발 동동' 기다린 방어집의 추억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냉채족발, 낙곱새...K-마리아주 '음식 궁합'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우리 시대 '최고의 소화제' 통닭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자동차 타이어'에 짓밟힌 최애 음식, 육회
- [김나현의 푸드에세이] 게으른 혼밥러에 딱인 '3분의 기적' 컵라면


